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에 여론이 국내외에서 들끓는 가운데, 연세대·한양대 교수가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미국 매체에 기고했다.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 부교수와 조셉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는 18일(현지 시각)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공동 기고한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우리는 한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로, 램지어 교수의 최근 논문을 비난하지 말고 토론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논문을 둘러싼 논쟁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의 공간이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두 교수는 “일본과의 개인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램지어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외국인 혐오로 들린다”고 했다. 이어 “램지어의 글에 한국의 시각이 결여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반한(反韓) 혹은 친일(親日) 부역자로 규정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한국의 관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위안부 여성과 관련한 연구와 논쟁이 제약을 받으면서 정치·사회 내 집단적 사고가 조성돼왔다”며 “강제 동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활동가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대학에서 조사를 받고 당국에 의해 기소된다”고 했다.두 교수는 2008년 발간된 소정희의 저서 ‘위안부:한국과 일본간 성폭력과 식민 이후의 기록’을 인용해 “활동가 단체들은 자신들의 얘기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들어맞는 정보는 부추겼다”고도 했다. 이들은 “책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는 초기 윤정옥 정대협 대표에게 ‘중국에서 위안소 관리자로 일하던 양아버지가 자신과 다른 소녀를 중국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1993년 발표된 증언에서는 양아버지의 역할이 삭제됐다”고 했다.이들은 생존자 보상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위안부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들이 일본의 보상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며 “2015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남한 대통령 합의에 따라 일본이 조성한 10억엔 기금에서 35명이 지급을 수용했다”고 했다.또 “아시아여성기금(군위안부 피해 지원을 위해 일본에서 1995년 설립돼 2007년 해산된 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생존자는 61명이었다”며 “더 많은 생존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활동가들이 이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했고,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보상금을 거부하도록 재정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또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의 학생들은 대개 일본의 식민 통치 이후 정부가 지원한 성 노동에 관해서도 아주 적은 인식을 갖고있거나 무지하다는 점”이라며 “고려와 조선은 수만 명의 공녀(貢女)를 중국에 보냈으며, 1945년 이후 25만~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때로는 격려를 받으며 미군 위안부로 일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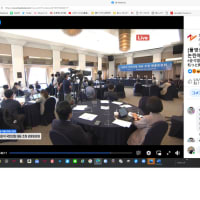








※コメント投稿者のブログIDはブログ作成者のみに通知されます